[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서울 동부권 첫 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지난 22일 첫 삽을 떴다.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 이번 공사는 착공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으며, 그동안 부지가 8차례나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동진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체육관·도서관 등 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배움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2779명에서 지난해 1만4546명으로 5년 새 13.8%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46명(52.6%)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니고, 특수학교 재학생은 4531명(3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중랑구 등 8곳에는 여전히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도 7곳뿐이며, 대부분 강남·서남권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동북권 학생들은 매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학생의 46.5%가 편도 30분 이상 통학하고 있으며, 8.8%는 1시간 이상 걸린다. 전남이 2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19%), 제주(15.5%), 울산(11.5%), 충북(10.8%), 경기(10.7%), 충남(10.1%) 순이었다. 일부 학생은 왕복 4시간 이상 통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수학생들이 과도한 통학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수학교 신·증설과 학급 확대를 통해 통학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내년 아이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지난 9월 이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배정받으려면 거주지와의 거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하는 학교에 꼭 배정됐으면 좋겠다”며 “정원이 6명뿐이라 경쟁이 치열해, 떨어지면 1년 뒤로 미루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거주지 이동과 입학 대기는 장애아 가정에서 흔한 일이 됐다. 현장에선 “학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야 입학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씁쓸한 농담이 나돌 정도다.
전국적으로도 배치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5만1896명으로, 그중 실제 배치된 학생은 4만5291명(배치율 87.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에서 2025년 5만1896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배치율은 같은 기간 93.8%에서 87.5%로 해마다 하락했다. 고등학교 배치율이 95.8%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원이 포화 상태여서 입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학생도 많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을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인천 학산초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등 8명을 담당하며 주당 29시수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다가 지난해 10월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그가 과로로 숨졌다고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법적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가까운 학교에 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특히 동북권 지체장애 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진학교와 함께 성동구의 성진학교가 개교하면 서울의 특수교육 인프라는 다소 확충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6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는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교육청 인가만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장애학생 역시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더 이상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13년을 기다려서야 학교가 세워지는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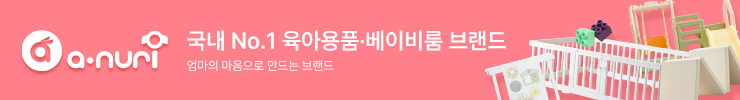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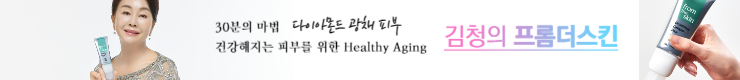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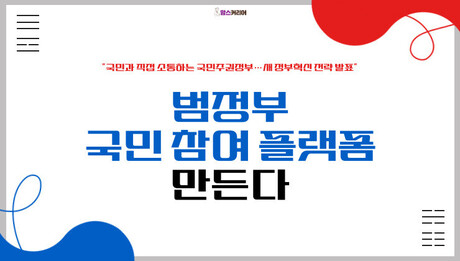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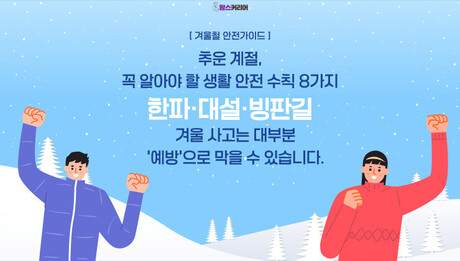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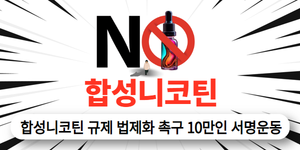
![[아이와 문화생활] 한글은 ‘한글용사 아이야’로 배워요!](/news/data/2025/09/23/p1065616863842460_728_h2.jpg)




